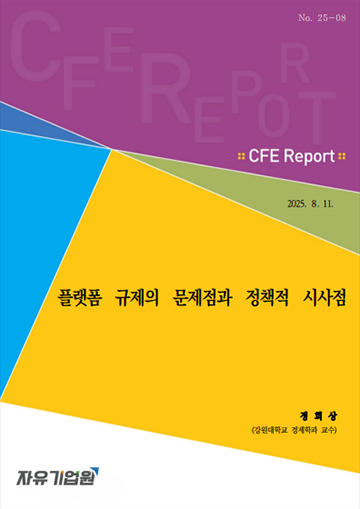
플랫폼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
글쓴이
정회상 2025-08-11
-
- CFE_REPORT_No.20_플랫폼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pdf
최근 발의된 플랫폼 규제 법안들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보다 신속하게 제재하기 위해 (1)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영향력이 큰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추정하거나 사전 지정하고, (2) 이들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반경쟁행위를 금지하며, (3) 그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배적 플랫폼에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방식은 주로 미국 거대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독일의 제10차 개정 경쟁제한방지법(GWB)을 참고한 것이다. 여기서 EU가 미국 거대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사전규제를 적용한 배경에는 자국 플랫폼 보호와 경쟁력 제고라는 정치·경제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플랫폼 시장에서 미국 거대 플랫폼의 점유율은 높지 않고, 플랫폼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하다. 또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경쟁법 집행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플랫폼 규제가 국내 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양면시장(two-sided markets)에서 플랫폼의 지배력을 시장점유율로 측정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플랫폼은 한쪽 이용자 그룹으로부터 얻는 이윤을 늘리기 위해 다른 쪽 이용자 그룹에 한계비용 이하의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쪽 시장 모두에서 더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진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보다 오히려 낮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양면시장에서 플랫폼의 높은 시장점유율이 반드시 높은 시장지배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한편, 4가지 금지행위는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어, 경쟁제한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플랫폼이 도매계약에서 높은 협상력을 가진 경우 자사우대(self-preferencing)는 자기상품 가격을 더 많이 인하하여 소비자잉여와 사회후생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타 플랫폼과의 경쟁 상황에서 자기상품 우대와 서비스 품질 향상은 효과적인 경쟁 전략이 될 수 있다.
플랫폼은 끼워팔기(tying)를 통해 주요 서비스 시장의 지배력을 부가서비스 시장으로 전이할 수 있지만,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각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이용할 때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끼워팔기로 제공되는 서비스 묶음을 이용할 수 있다. 더욱이 끼워팔기를 통해 플랫폼이 개별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면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수도 있다.
플랫폼의 한쪽 이용자들은 싱글호밍(single-homing)하고 다른 쪽 이용자들은 멀티호밍(multi-homing)하는 경쟁적 병목(competitive bottleneck) 상황에서, 플랫폼은 싱글호밍 이용자(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반면, 멀티호밍 이용자(판매자)에 대해서는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멀티호밍 이용자에게 불리하며, 만약 이들이 어느 정도 협상력을 가진다면 플랫폼도 불리해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과 멀티호밍 이용자는 배타적 계약을 통해 멀티호밍을 제한할 유인이 있는데, 이 경우 플랫폼과 멀티호밍 이용자의 이윤은 증가할 수 있지만, 싱글호밍 시장에서의 경쟁은 완화되어 소비자 후생은 감소할 수 있다.
플랫폼 최혜대우(most favored nation) 요구란 판매자(입점업체)에게 자사 플랫폼에서의 거래조건을 다른 플랫폼에 비해 동등하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최혜대우 요구를 플랫폼과 판매자 간 가격담합이 아니라 플랫폼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수직적 제한행위로 본다면, 해당 행위는 효율성 증대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예컨대 플랫폼 간 경쟁이 판매자 간 경쟁보다 치열한 경우, 최혜대우 요구는 플랫폼의 투자를 증대시켜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EU와 독일의 사전규제 방식을 그대로 반영한 법안은 한국 실정에 부합하지 않고, 합리적 근거도 부족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4가지 금지행위는 경쟁제한성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공정위가 경쟁제한 효과를 입증한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제재해야 한다. 만약 지배적 플랫폼의 반경쟁행위에 예외적으로 당연위법 원칙을 적용하려 한다면, 이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목 차>
I. 논의 배경 및 목적
II. 지배적 플랫폼 추정의 문제점
III. 지배적 플랫폼 금지행위의 경쟁 효과
1. 자사우대
2. 끼워팔기
3. 멀티호밍 제한
4. 최혜대우 요구
IV. 정책적 시사점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