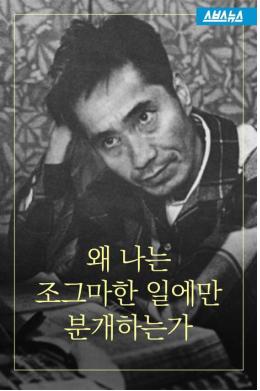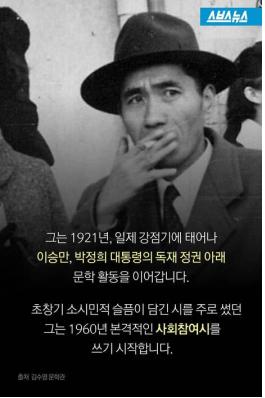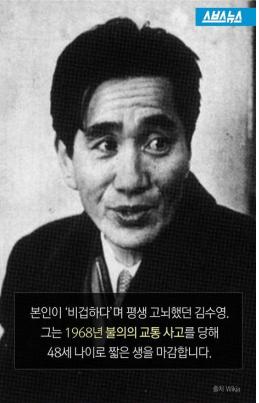예로부터 한 시대의 문제를 꼬집고 비판하는 문학작품은 대중의 환영을 받아왔다. 그 중에서 일제시대에
태어나 소시민적 슬픔이 담긴 시를 썼던 김수영은 1960년 본격적으로 사회참여시를 쓰기 시작하며 평단에 이름을 알린 대표적 인물이다. 김수영
시인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일찍 등졌지만 그의 작품은 문단의 지지를 받으며 더 큰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김수영의 사회참여시는 대중의 분노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어버렸다. 자유경제원은 ‘김수영 가짜 신화’가 만들어진 배경과 문단권력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비판하는 자리를 14일
마련했다.
패널로 나선 남정욱 숭실대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는 “민족주의 좌파 문단의 필요에 의해 김수영 시인은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졌다”며 “김수영은 모더니즘 시들이 대개 그러하듯 지독한 자의식의 발산을 꾀했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이런 시를 쓰던
사람을 저항시인이자 민중시인으로 만들려 했으니 그들의 노고가 애처롭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교수는 “김수영을 자유와 저항의 관점에서 떠받드는
사람치고 그의 작품을 다섯 개 이상 아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죽어서 말이 없는 김수영 시인을, 그들은 불온과 저항의
아이콘으로 띄웠다”고 언급했다. 아래 글은 남정욱 교수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
 |
|
| ▲ 남정욱 숭실대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 |
그들이 띄운 불온과 저항의 아이콘 김수영
띄운다. 필요에 의해 실제 이상으로 부풀리는 경우를 말한다. 띄울 대상이 외모 자본이 있거나 말言舌이 좋으면 좋은 조건이다. 최상의
조건은 죽어서 말이 없는 경우다. 한참 띄우는 데 당사자가 “그거 아닌데요” 해버리면 그보다 맥 빠지는 일이 없다. 해서 띄우는 일은 대부분
사자死者의 리스트에서 적당한 재목을 찾는 데서 시작된다.
시詩에서 시市민사회를 만들어 낸 것은 대단한 공력이다. 시민은 서민과 다르고 국민과도 다르며 인민과도 다르다. 서민은 상처받는
이름이다. 국민은 몰려가는 이름이다. 인민은 분노하는 이름이다. 시민은 좀 뉘앙스가 다르다. 시민은 교양을 갖추고 비판의식을 가진
이름이다.
둘은 교양과 비판이 균형을 맞추면서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새 부터인가 이 부등호는 교양 < 비판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흐름은
공식으로 부동화된다. 누가 한 말인지 이제 기억도 안 나지만 70년대 중반 ‘지식인은 비판하는 존재다’라는 말의 연장선상에서 끌어낸 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현재의 시민이고 이들이 가진 ‘매사’의 비판 의식이 ‘건강한’ 시민의식이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지표가 될 만한 모델이 있어야 했다.
4.19 이후 이 작업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후보는 둘로 압축됐다.
하나는 ‘껍데기는 가라’의 신동엽이고 하나는 김수영이다. 껍데기는 4.19라는 시대정신에는 어울렸지만 촌티가 났다. 도시가 생활이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 촌티는 죄악이다. 그래서 낙착된 게 김수영이다. 결과적으로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다. 모더니즘이라는 약점이 있었지만(시가
어렵다) 그건 전근대성의 반대말이기도 했으므로 약점인 동시에 강점이었다. 어쩌면 관념적인 시인이 어떤 계기로 사회비판의식에 눈을 떴다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었다. 이제껏 무지하던 인간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제의 무지한 나를 청산하고 오늘부터 건강한 비판인人, 이것이
그들이 찾아낸 모델이자 오늘 날 시민의 전형이 된 일의 유래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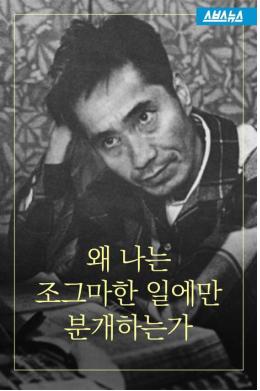 |
|
| ▲ 김수영의 시는 쉽지 않다. 게다가 그는
영문과 출신이다. 이는 김수영의 엘리트적 자의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했을 것이다. 사진은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김수영
시인의 카드뉴스./자료사진=SBS 스브스뉴스 |
그러나 그 작업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었다. 권위의 해체와 청산이다. 당대 문단의 주류를 폭파하고 물줄기를 바꿀 필요가 있었다.
정지용, 김기림, 백석, 이용악, 오장환, 임화 등이 이때 동원된 이름들이다. 노태우 정부 시절 해금解禁조치로 이들은 되살아난다. 그렇게
월북작가들은 김소월, 한용운, 이상, 서정주, 유치환, 이육사, 윤동주,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김춘수 등 자유주의 문학진영(문단에서는
순수문학으로 불린다)의 주류 시인들과 거의 같은 반열에 오른다. 이들을 불러낸 이데올로기는 물론 민족주의다. 정지용의 ‘향수’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다. 농촌의 목가적인 풍경은 아취로 포장되어 민족의 정서가 된다. 정확히는 조선으로의 회귀라는 퇴행성 정서다. 가끔은 문단의 주류가
이들이 아닌가 착각하게 만드는 놀라운 공작이다.
말한 대로 김수영의 시는 쉽지 않다. 게다가 그는 영문과 출신이다(졸업은 하지 않았다). 1946년부터 48년까지 연희전문을 다녔는데
이때 영어로 된 잡지와 서책을 접한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있었을까. 그것은 시인의 엘리트적 자의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했을 것이다.
가령 이런 시가 그렇다.
plaster
나의 天性은 깨어졌다
더러운 붓끝에서 흔들리는 汚辱
바다보다 아름다운 歲月을 건너와서
나는 태양을 줏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설마 이런 것이 올 줄이야
怪物이여
지금 涸渴詩人의 絶頂에 서서
이름도 모르는 뼈와 뼈
어디까지나 뒤퉁그러져 나왔구나
- 그것을 내가 아는 가장 悲慘한 親舊가 붙이고 간 名稱으로 나는
整理하고 있는가
나의 名譽는 부서졌다
비 대신 黃砂가 퍼붓는 하늘 아래
누가 지어 논 무덤이냐
그러나 그 속에서 나는 腐敗하고 있었던 것
- 그것은 나의 앙상한 生命
PLASTER가 燃上하는 냄새가 이러할 것이다
汚辱ㆍ뼈ㆍPLASTERㆍ뼈ㆍ뼈
뼈ㆍ뼈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954>
涸는 후 혹은 학으로 발음하는데 둘 다 마르다라는 뜻이다. 난해하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모더니즘 시들이 대개 그러하듯 지독한
자의식의 발산이다. 이런 시를 쓰던 사람을 저항시인, 민중시인으로 만들려 했으니 노고가 애처롭다. 그래서 김수영을 자유와 저항의 관점에서
떠받드는 사람치고 그의 작품을 다섯 개 이상 아는 사람은 없다. 오로지 이거 하나만 죽어라 외워댄다.
푸른 하늘을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왔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
<1960.6.15>
태그는 자유, 피, 혁명 , 고독이다. 그들은 멀쩡한 모더니즘 시인 하나를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에 눕혀놓고 프랑켄슈타인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래놓고 좋다고 난리다. 가령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김수영 시인을 참 좋아했다. 고등학교 때 김수영 시집 하나만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했다. 그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었던
시가 '푸른 하늘을'이었다. 김수영 시는 굉장히 난해하고 헷갈린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푸른 하늘을'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득도(得到)하는
느낌이었다. 첫 구절이 "푸른 하늘을 制壓(제압)하는 노고지리가 自由(자유)로웠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詩人(시인)의 말은 修訂(수정) 되어야
한다"다. 당시 내가 고1 때였으니, 유신시대였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스스로 날면 된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 -
한홍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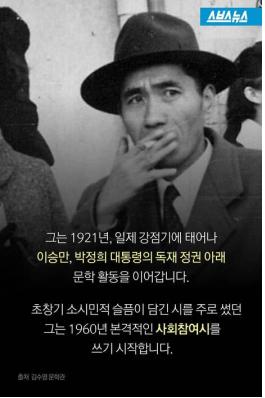 |
|
| ▲ 모더니즘 시들이 대개 그러하듯 김수영은
시를 통해 지독한 자의식을 발산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김수영을 저항시인, 민중시인으로 만들려 했다. 사진은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김수영 시인의 카드뉴스./자료사진=SBS 스브스뉴스 |
뭐의 눈에는 뭐 밖에 안 보였던 모양이다. 김수영은 동시를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인이다. 김수영은 시를 코믹하게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인이다. 이런 미덕은 싹 빼버렸다. 한홍구와 같은 고등학교 1학년 무렵 내가 좋아했던 김수영의 시는 이거였다.
性
그것하고 와서 첫 번째로 여편네와
하던 날은 바로 그 이튿날 밤은
아니 바로 그 첫 날 밤은 반시간도 넘어 했었는데도
여편네가 만족하지 않는다
그년하고 하듯이 혓바닥이 떨어져나가게
물어제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지간히 다부지게 해줬는데도
여편네가 만족하지 않는다
이게 아무래도 내가 저의 섹스를 槪觀하고
있는 것을 아는 모양이다
똑똑히는 몰라도 어렴풋이 느껴지는
모양이다
나는 섬찍해서 그전의 둔감한 내 자신으로
다시 돌아간다
연민의 순간이다 황홀의 순간이 아니라
속아 사는 연민의 순간이다
나는 이것이 쏟고 난 뒤에도 보통 때보다
완연히 한참 더 오래 끌다가 쏟았다
한 번 더 고비를 넘을 수도 있었는데 그만큼
지독하게 속이면 내가 곧 속고 만다
<1968.1.19.>
김수영 시 전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호흡으로 읽으면 어느 쪽이 김수영 스타일인지 알 수 있다. <性>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푸른 하늘을>은 절대 절대 절대 아니다. /남정욱 숭실대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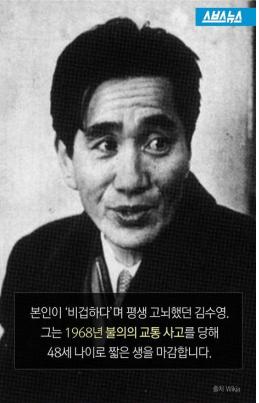 |
|
| ▲ 김수영은 동시를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인이다. 김수영은 시를 코믹하게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인이다. 사진은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김수영 시인의
카드뉴스./자료사진=SBS 스브스뉴스 |